세금
보유세 높이면 정말 집값 내릴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2025.11.03 13:51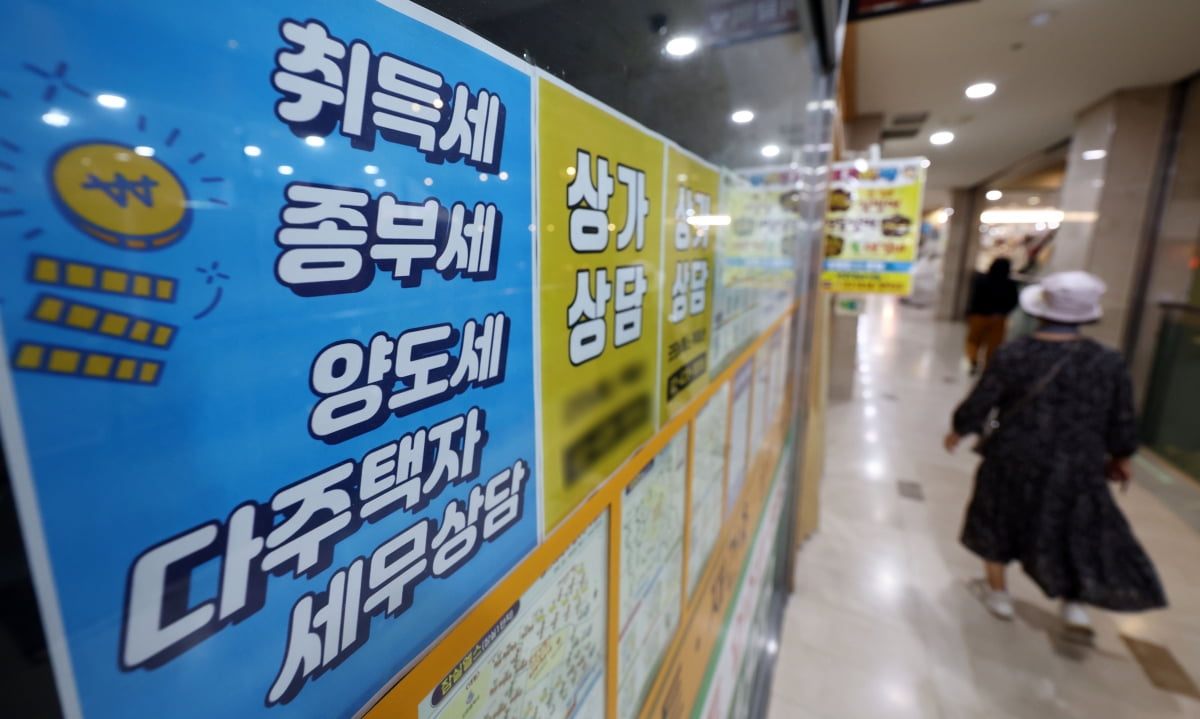
최근 주택의 보유세 인상론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미국 각 주별 보유세 평균치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에 더해 가구당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과도하게 높다거나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된 비중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보유세 하나만을 가지고 높다거나 낮다는 식으로 문제를 삼기에는 논의가 충분치 않습니다.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상황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의 이름은 여럿이어도 제2, 제3의 도시를 따지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이 되고,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지방의 저렴한 집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보유세만을 비교하기보다는, 각 국가마다 도시별로 인구가 집중되거나 분산된 곳들이 있는 것 등을 논의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집에 대한 세금이 불충분하다는 주장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이나 인구로 인한 주택수요를 어떻게 물리적인 범위로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절한 접근방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정책이 이에 해당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주식, 금, 가상화폐 등 각종 투자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Everything rally)'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투기세력이 시장에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인 부동산, 그것도 특정 지역범위 내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택가격이 오르면 안된다는 수요억제의 정책방향이 얼마만큼의 실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개편을 집값을 잡겠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시각이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의 맥락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재산세를 전반적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지속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사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의 정석으로 자리 잡고, 기업형 임대나 공공임대로 전면대체할 수 없는 임대시장 등이 영향받은 것에 추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유세 등의 세제개편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주택가격을 지불한 뒤 매년 보유세를 내면서 개인의 생활수준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되면 부동산은 지위재(Positioning goods)로 확정됩니다. 물론 '어떤 동네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는 아니다'라는 과거의 표현이 '어떤 동네에 살면 모두가 부자다' 라는 미래의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올해 종부세는 얼마일까?
세무서 방문 없이 예상세금 무료 확인
